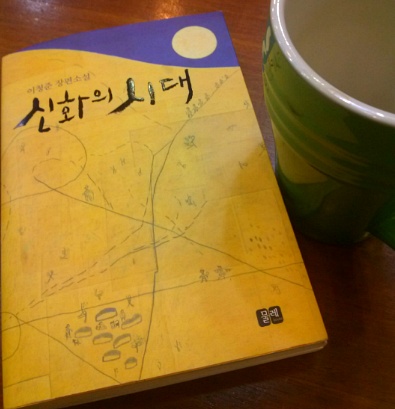
이청준의 작품 <신화의 시대> 작품 말미에 작가에게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환경적 동기로 태생이 시골내기임을 이야기 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회귀 혹은 확인의 과정이며 시골살이와 도회살이의 체험적 동기가 작가의 삶과 소설의 중요한 두 축으로 총체적 삶의 이해의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나에게 있어 이청준 작품의 매력은 친숙한 고향의 느낌이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듯는 듯한 착각과 내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흐릿한 아련함 그래서 그의 책 읽기는 항상 가슴 저리다. 두번째는 이야기의 구조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지 않는 계속해서 읽어야만 마지막을 알 수 있는 스토리와,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는 결말이 좋아서이다. 세번째는 그의 소설이 지니고 있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생각하게 하는 힘이며, 무엇보다 글 읽기가 재미 있다.
이청준의 작품들은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는데 <병신과 머저리> <석화촌> <이어도> <축제> <밀양>그리고 연작소설 <남도사람>은 영화 <서편제>로 만들어졌다. 평론가들도 그의 작품이 정확이 몇권이고 얼마만큼인지 모를정도로 다작한 작가이지만 그의 작품은 모두 살아있더라
그가 귀천한지도 어언 오년이 지났다. 아직도 슬프다. 내가 꼽는 그의 최고의 작품은 단편소설 '눈길'이지만 (눈길은 늘상 날 아프게 한다) 장편이든 단편이든 요번 겨울엔 그의 작품을 만나보라고 권하고 싶다.
뽀나스로 작품 <눈길>의 한대목
어린 자식놈의 처지가 너무도 딱해서였을까. 아니 어쩌면 노인 자신의 처지까지도 그 밖엔 달리 도리가 없었을 노릇이었는지 모른다. 동구 밖까지만 바래다 주겠다던 노인은 다시 마을 뒷산의 잿길까지만 나를 좀더 바래 주마 우겼고, 그 잿길을 올라선 다음에는 새 신작로가 나설 때까지만 산길을 함께 넘어 가자 우겼다. 그럴 때마다 한 차례씩 애시린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않았다.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노인의 말마따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신작로까지 나섰다. 그러고도 아직 그 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그 면소 차부까지도 노인과 함께 신작로를 걸었다.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우리는 어찌 되었던가.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가 버렸고, 노인은 다시 그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 뿐이었다.
노인이 그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 두고 차로 올라서 버린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 싫었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 날의 뒷 얘기는 들려 준 일이 없었다. 한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어떻게 어떻게 장터 거리로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일 만한 데까지 가니까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를 나오는구나. 급한 김에 내가 손을 휘저어 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그 운전수란 사람들은 어찌 그리 길이 급하고 매정하기만 한 사람들이더냐. 차를 미처 세우지도 덜하고 덜크렁덜크렁 눈 깜짝할 사이에 저 아그를 훌쩍 실어 담고 가 버리는구나.”
잠잠히 입을 다문 채 듣고만 있던 아내가 모처럼 한 마디를 끼어 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지고 있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을 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 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 오고 있었다.
“어떻게 하기는야. 넋이 나간 사람마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찻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을거나….”
노인은 여전히 옛 얘기를 하듯 하는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 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았겄냐. 지금까진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 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서려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한 식경이나 차부 안 나무 걸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제사 동녘 하늘이 훤해져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디,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혀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겄냐. 눈발이 그친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겄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겄냐. 오목오목 디뎌 논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빌고 왔제…”
|
'서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산평전 중 가계(家誡) (0) | 2015.02.03 |
|---|---|
| 남녀상열지사 '쌍화점' (0) | 2015.02.01 |
| [시집 소개] 참 좋은 당신 (0) | 2015.01.31 |
|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김용택 산문집 (0) | 2015.01.31 |
| 노래가 된 시 (0) | 2015.01.30 |




